아폴로 14의 '지구돋이'와 '달나무'
 그래그래
0
224
0
0
2021.02.15 00:36
그래그래
0
224
0
0
2021.02.15 00:36
[서울신문 나우뉴스]
지금으로부터 딱 50년 전인 1971년 2월 7일, 아폴로 14호의 승무원들은 달 궤도를 떠나 고향으로 향했다. 사진의 '지구돋이(Earthrise)'는 그들은 타고 있던 키티호크 사령선에서 본 광경이다. 초승달 모양으로 빛나는 지구가 크레이터로 뒤덮인 달의 지평선 위로 장엄하게 떠오르고 있다.
지구에서 달이 뜨고 지는 것처럼 달에서도 지구가 뜨고 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달에서는 지구가 뜨고 지는 것을 볼 수 없다. 실제로 해는 하루에 한 번씩 뜨고 지지만 지구는 항상 거의 같은 자리에 보인다. 사진 속 지구돋이는 아폴로 우주선이 달을 돌면서 달의 지평선 너머로 지구가 보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이처럼 달 궤도를 도는 동안 승무원들은 지구가 뜨고 지는 모습들을 봐왔지만, 달 표면의 프라 마우로 크레이터에 있던 동안에는 지구가 하늘의 한 곳에 가만히 고정된 것처럼 보였다.
또한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같은 면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달에서 보는 지구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달은 한 달에 한 번씩 자전하면서 공전한다. 이것을 동주기 자전이라고 한다. 이는 곧 달이 지구 인력에 붙잡혀 꼼짝 못하고 공전만 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구의 엄청난 중력 때문에 지구에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싫든 좋든 항상 지구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달이다. 따라서 지구 행성인들은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다.
아폴로 14에서 본 ‘지구돋이’(출처=Apollo 14, NASA, JSC, ASU (Image Reprocessing: Andy Saunders)아폴로 14우주인들이 프라 마우로에서 가지고 온 달 샘플 중에는 빅 베르타(Big Bertha)라는 별명이 붙은 9㎏짜리 암석이 포함되어 있었다. 빅 베르타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사용한 거대 대포로, 이 돌이 당시까지 달에서 가져온 가장 큰 월석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역대 달에서 가져온 세 번째로 큰 돌인 빅 베르타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그로부터 48년이 지난 바로 2019년 1월이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 것은 운석에 포함된 아주 작은 양의 파편을 분석하는 기술이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이니다. 운석에 포함된 작은 파편들은 지구에서는 흔하게 발견되지만 달에서는 볼 수 없는 화강암 성분들이었다. 결국 과학자들은 빅 베르타가 40억년 이상 전에 지구에서 날아온 운석이자 가장 오래된 지구의 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지구의 돌이 어떻게 달에서 발견된 것일까? 그것은 40억 년 이상 전에 이 정도 돌덩어리를 달까지 날릴 수 있는 엄청난 소행성 충돌이 지구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무렵에 이미 지구에서 대륙을 형성하는 화강암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달에서 발견된 돌 하나로 인해 수십 억 년 전의 지구 비밀이 밝혀지고 있는 셈이다.
미 아칸소주 포트 스미스에 있는 세바스찬 카운티 법원 앞의 달나무인 테다소나무.다른 에피소드도 있다. 키티호크를 타고 비행하는 동안 아폴로 14호에는 나무 씨앗 500여 개가 담긴 캔이 실려 있었다. 당시 아폴로 14호의 사령선 조종사로 탑승했던 스튜어트 루사는 과거 자신이 삼림 소방대원으로 근무했던 미 산림청을 기리기 위해 소합향, 삼나무, 소나무, 미송나무 등 500여 종의 나무씨앗을 작은 깡통 속에 담아 갔던 것이다. 당시 달착륙선 안타레스호가 달의 프라 마우로 크레이터에 착륙했을 때, 사령선 조종사인 루사는 임무차 가져온 씨앗들과 함께 달 주위를 34회가량 공전한 후 우주인들과 같이 귀환했다.
귀환 후 씨앗은 발아를 목적으로 미시시피 주 걸프 포트 남부 산림청과 캘리포니아 플레이서빌 서부지구로 보내졌다. 거의 모든 씨앗이 성공적으로 발아했으며 산림청은 몇 년 후 약 420주의 묘목을 얻었다. '달나무'의 대부분은 건국 2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심기 위해 1975년과 1976년에 많은 주 산림 단체에 기부되었다.백악관에는 테다소나무(Loblolly Pine)를 심었고, 스위스, 브라질 등지에도 심었다.
이후 산림청은 달에 갔다 돌아온 씨앗들을 비롯, 이와 똑같은 수종의 다른 씨앗들을 숲속에 심어 생장과정을 비교했지만, 40년이 지난 후에도 두 종류의 나무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450여 그루의 달나무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광식 칼럼니스트 joand999@naver.com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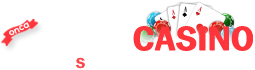




 보헤미안
보헤미안 streem
streem 비트팟
비트팟 비공개
비공개 모스코스
모스코스 마법사
마법사 비노
비노 이실장
이실장 오잉
오잉 아이리스
아이리스 겨울엔오사카로
겨울엔오사카로 스트롱맨
스트롱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