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자 돌진에 3명 즉사…가해차량 보험사가 구상금 소송
대법 "점등안한 피해車도 과실"…원고패소 판결 2심 파기 서울 서초동 대법원 깃발.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깃발. © News1 성동훈 기자(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만취 운전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상대 차량이 해가 진 뒤 점등을 하지 않고 정차 중이었다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박모씨는 2011년 10월 해가 진 뒤 전북 진안군 한 편도 1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점등을 하지 않고 정차 중이던 전선 지중화 작업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이 중 1대에 타려고 이동 중이던 피해자 3명은 이 사고로 즉사했다.
한화손해보험은 피해자 중 1명과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또 해당 작업차량은 디비손해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디비손해보험은 해당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이 사고를 무보험차량 사고로 보고 한화손해보험에도 절반인 7566만여원을 청구해 받았다.
그런데 이후 한화손해보험은 점등을 하지 않고 정차해 있던 작업차량에도 사고 발생의 과실이 있다며 앞서 지급한 보험금 절반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작업차량들이 해가 진 뒤 점등을 하지 않고 정차해있던 것이 사고 발생 원인이 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사고 발생 시각이 일몰 이후로 작업차량이 등화를 켜고 있었다면 박씨가 이를 충분히 피해 운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화손해보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이 사고는 박씨의 비정상적 음주운전이 원인이 됐다고 보일 뿐"이라며 "사고 발생과 작업차량 2대의 주차 위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모든 차 운전자는 밤에 도로에서 주정차를 하는 경우 등을 켜서 다른 차량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선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0.5미터 이상 거리를 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을 들어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작업차량들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점등을 하고 우측 공간을 확보해 정차했다면 가해차량이 보다 멀리서 작업차량들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일행이 작업차량들 우측으로 보행해 최소한 전원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가해차량 과실이 중대하다고 해 작업차량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할 수도 없다"며 작업차량들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smith@
news1
.kr  Sadthingnothing
0
453
0
0
2019.09.11 14:44
Sadthingnothing
0
453
0
0
2019.09.11 1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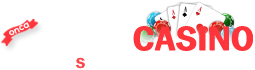



 보헤미안
보헤미안 streem
streem 비트팟
비트팟 비공개
비공개 모스코스
모스코스 마법사
마법사 비노
비노 이실장
이실장 오잉
오잉 아이리스
아이리스 겨울엔오사카로
겨울엔오사카로 스트롱맨
스트롱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