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材 잃고 人災 될라! 기로엔 선 교육정책
 북기기
0
403
0
0
2022.11.01 02:06
북기기
0
403
0
0
2022.11.01 02:06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눈에 띄게 다른 정부 부처와 다른 점이 있다. 홈페이지 부처 소개에 현직 차관만 나와 있고, 전직 장관과 전직 차관에 대한 어떠한 소개도 나와 있지 않다. 어느 기관이나 홈페이지 소개란에 대표자 소개가 있는 것처럼 다른 정부 부처 소개에는 현직 및 역대 장·차관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주호 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어서 현직 장관을 비워두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역대 모든 전직 장관과 차관에 대한 정보까지 가려두는 걸 보면 지난 5개월 동안 장관 인사와 관련된 부침이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 5개월간의 교육부 장관 인사 관련 풍파에 오죽 시달렸으면 대한민국 역대 교육부 장관 60명과 차관 62명을 홈페이지에서 송두리째로 지웠을까? 늦은 봄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은 첫 서리가 내릴 때까지 공석이나 마찬가지다. 오랜 기간 동안 교육부 장관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서버 화재와 같은 큰 사고가 교육계에서 벌어지지 않는 건 우리나라 교사와 직업 공무원 제도의 우수성 때문이라고 위안을 삼을 뿐이다. 90조원의 예산을 쓰는 부처에서 말이다.
20년간 방치된 국가인적자원개발
홈페이지에서 역대 장관을 다 지울 정도로 새롭게 의지를 다지는 교육부는 이주호 장관 임명자의 관심사에 조직의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와 열정이 충만했던 이명박 정부의 40대 장관이 60대가 되어 교육부총리가 되어서 귀환을 하니 조직은 긴장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호랑이 장관이 돌아와서 주눅이 들었을지 모른다. 임명자 입장에서는 과거 재직 당시보다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시·도 교육감의 권한이 커진 상태가 편하진 않을 거다. 게다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가져온 심리적·정서적 이완감도 익숙하지 않을 것 같다. 외우내환이다. 어렵고 괴로운 과제들이 많겠지만 홈페이지 삭제하듯이 회피하거나 덮지 말고 중요한 문제부터 하나하나씩 대면하여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조직법상의 의무를 다하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정부조직법 제28조에는 "교육부 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말이 정부조직법에 실리게 된 것은 김대중 정부가 어렵게 교육계와 지지층을 설득한 결과다. '사람을 어떻게 자원으로 보느냐'는 논리는 진보 교육계만의 시각이 아니었다. 이를 설득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그 덕에 교육부 장관은 관계 부처를 관장하는 부총리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심지어 부총리가 맡았던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의장을 대통령 업무로 격상시켰다. 2005년 마련된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자그마치 20개 부처의 공동작업이었다. '미래 유망산업을 이끌 핵심 인력 양성' '산학협력 활성화로 인력의 양적·질적 불일치 해소' '저출산·고령화, 국제화 등 환경 변화에 맞춘 학제 개편'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양극화 극복' '여성 및 중·고령층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제고' 등의 방안은 당시 계획의 일부이다. 요즘의 사회문제가 20여년 전 이미 예측되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셈이다.
국가인적자원위 15년간 개점휴업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라고 비난받았던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중단된 것은 오히려 보수 타이틀이 붙어 있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다. 이른바 'ABR(Anything But Roh): 노무현 정부 것은 뭐든지 부정한다'는 기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 대신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하면서였다. 그동안 이름이 몇 번 바뀐, 정부 조직법상의 교육 관련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이고 지금의 교육부 업무에서도 인적자원개발정책은 늘 제일 앞에 있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겠다던 지난 정부에서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2007년 12월 13일이 마지막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회의 날짜였다. 이후 15년간 국가는 법을 집행하지 않았고 담당부처인 교육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이 법을 그대로 지키기만 했으면 대통령이 경제부처를 굳이 언급하며 새삼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반도체 인력 양성은 교육부의 당연한 업무 중 하나가 돼 있었을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인구를 연령별로 볼 때 돼지띠인 1971년생이 제일 많았다. 1971년생은 1958년 개띠보다도 출생자가 많다. 102만4773명이 태어나서 94만4179명이 생존해 있다. 이들이 대학에 가던 1990년에는 76만1922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재수생 이상을 합친 숫자이겠지만 1971년생이 대학에 주로 진학하던 1990학년도 지금의 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학력고사 접수인원은 87만2627명에 달했고 대학진학률은 23.6%였다. 그해 전국의 일반대(4년제) 정원은 19만6550명이었다. 전문대, 교대, 산업대, 방송통신대학이 포함된 입학정원은 38만8510명이었다. 당시 한국의 국내 총생산액은 2790억달러, 2021년 국내총생산은 약 1조8000억달러다. 경제 규모가 6배 커진 것이다.
반면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562명이다. 50년 전보다 4분의1로 줄었다. 학령인구가 줄어서 학교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4분의1 토막 난 인구로 6배 커진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앞에 놓여 있다. 대학 교육을 의무교육화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20년이 채 남지 않았다. 20년은 긴 시간이 아니다. 대학 진학을 입시문제라는 교육계의 지엽적 문제가 아닌 시민의 생존과 번영의 지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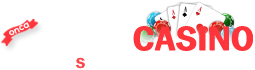


 보헤미안
보헤미안 streem
streem 비트팟
비트팟 비공개
비공개 모스코스
모스코스 마법사
마법사 비노
비노 이실장
이실장 오잉
오잉 아이리스
아이리스 겨울엔오사카로
겨울엔오사카로 스트롱맨
스트롱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