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사들 “아프리카서 백신 테스트하자” …더 노골화하는 인종차별
 그래그래
0
306
0
0
2020.04.05 22:14
그래그래
0
306
0
0
2020.04.05 22:14
 장 폴 미라 파리 코친병원 집중치료실장(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프랑스 뉴스방송채널 LCI의 토론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에서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에이즈 시약 연구를 한 사례가 있다”며 “마스크, 의약품, 집중치료실이 없는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백신 테스트를 하자”고 제안했다. 카밀 로히트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소장도 맞장구를 쳤고, 이들의 제안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LCI방송화면 갈무리
장 폴 미라 파리 코친병원 집중치료실장(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프랑스 뉴스방송채널 LCI의 토론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에서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에이즈 시약 연구를 한 사례가 있다”며 “마스크, 의약품, 집중치료실이 없는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백신 테스트를 하자”고 제안했다. 카밀 로히트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소장도 맞장구를 쳤고, 이들의 제안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LCI방송화면 갈무리
전염병은 바이러스와 함께 혐오를 퍼뜨린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전염병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고, 이 때문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하면 약자와 이방인들은 혐오의 ‘타깃’이 된다.
4일(현지시간)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만명을 넘어서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가 노골적으로 번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아프리카에서 실험하자고 제안한 프랑스 의료전문가부터 해외 유입 확진 사례가 늘자 외국인을 향한 혐오 시선을 보내는 중국까지 인종차별의 행태는 각양각색이다.
프랑스에서는 의료전문가들이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테스트해보자”고 제안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장 폴 미라 파리 코친병원 집중치료실장은 지난 1일 뉴스방송채널인 LCI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에서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에이즈 시약 연구를 한 사례가 있다”면서 “마스크, 의약품, 집중치료실이 없는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백신 연구를 해보자.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지 않으냐”고 했다. 그의 말에 카밀 로히트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소장도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발언은 아프리카계 유럽인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등 논란을 불렀다. 인체 임상시험을 하려면 피실험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개발부터 임상시험까지 수년이 걸린다. 지난해 나온 에볼라 백신은 개발하는 데 42년이 걸렸다. 그런데도 선뜻 아프리카를 위험한 실험의 무대로 쓰자고 한 것이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에서 뛰었던 코트디부아르 출신 디디에 드로그바는 3일 트위터에 “아프리카는 실험실이 아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기니피그로 보지 말라”고 썼고, 이스탄불 바샥셰히르에 뛰는 세네갈계 프랑스인 뎀바 바는 “백인들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서구에 온 걸 환영한다”고 비꼬았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미라 실장은 허핑턴포스트에 “인종차별의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 환자가 많은 아프리카는 전염병 위험이 더 크지만 의료적 시도는 다른 곳보다 적게 시도되고 있지 않으냐”고 변명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도 신규 확진자 상당수가 해외입국자로 바뀌면서 외국인에 대한 일상의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상하이에 거주 중인 아일랜드인 앤드루 호반(33)은 가디언에 “내 파란 눈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재빠르게 피해갔다”고 했다.
아프리카계 외국인 커플은 식당에서 2시간을 기다렸지만 자리를 안내받지 못했다고 가디언에 전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미국인 역사학자 제레미아 젠은 “중국 언론에서 코로나19를 외국 바이러스로 보도하기 시작한 것의 효과”라며 “비난의 잣대는 나라 밖에서 온 사람들에게로 향했다”고 했다.
세계 곳곳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아시아 포비아’도 만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때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지칭했는데, 이 역시 아시아 포피아를 부추기고 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라이트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상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혐오 발언은 코로나19 이전보다 900% 증가했다.
사실 인종차별의 역사는 전염병의 유행과 그 궤적을 같이한다. 실제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의 대유행 땐 중국·아시아가,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질 때는 아프리카가 표적이 됐다. 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은 “전염병이 키운 공포는 결국 차별과 혐오로 번져간다”고 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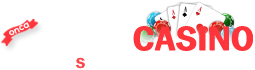

 보헤미안
보헤미안 streem
streem 비트팟
비트팟 비공개
비공개 모스코스
모스코스 마법사
마법사 비노
비노 이실장
이실장 오잉
오잉 아이리스
아이리스 겨울엔오사카로
겨울엔오사카로 스트롱맨
스트롱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