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에게 플라스틱 먹이는 알바트로스, 가슴 아팠다
 보헤미안
0
1346
0
0
2019.02.23 01:36
보헤미안
0
1346
0
0
2019.02.23 01:36
누군가에겐 법조인이 삶의 목적이겠지만, 누군가에겐 아니었다. 미국의 법학 박사 크리스 조던(Chris Jordan·56)은 10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2003년 그만뒀다. 아예 면허까지 반납했다. 대신 카메라를 들었다. 산업 폐기물이 쌓여있는 야적장을 돌아다녔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각종 쓰레기의 수치에 주목했다. 폐휴대폰들이 도도한 소용돌이를 이루고 낡은 회로판들이 고대 도시의 신전을 연상시키는 ‘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 시리즈, 쌀알 만한 비닐 봉투 사진 24만 개(이 숫자는 전세계에서 10초마다 사용되는 비닐 봉투의 추정치다)를 합성해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으로 형상화하는 식의 ‘숫자로 본 미국인의 자화상’ 연작은 현대 소비사회가 만들어내는 불편한 진실을 아름답게 보여준다. 시각적으로 탁월한 그의 작품을 가만히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득 소름이 끼치는 이유다. 22일 서울 성곡미술관에서 시작된 한국 첫 개인전 ‘크리스 조던: 아름다움 너머’(5월 5일까지)를 위해 내한한 그를 만났다.
Q :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예술가가 됐다.
A : “변호사라는 직업은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삶이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는 공포였다. 물론 변호사를 그만둘 때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느낌이었지만, 작가를 하면서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
Q : 아버지가 사진가, 어머니가 수채화가인 예술가 집안이다.
A : “로스쿨 시절부터 사진가가 되고 싶었다. 내 소명은 예술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술가로서 실패할까봐 두려웠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변호사 생활 10년 만에 알게 됐다. 바로 내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뒤에는 굉장히 쉬웠다.”
Q : 재정적으로는 어떤가.
A :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느냐(웃음). 돈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다. 내 작품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쓰도록 할 생각이다. 8년간 만든 영화도 내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세상에 바치면 먹고 살 정도는 생긴다는 것이 내 철학이다. 영화 만들며 생긴 빚이 20만 달러(약 2억 2500만원) 정도 있긴 하지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작업할 때뿐이다.”
Q : 컴퓨터 합성 작업이 많은데, 팀이 있나.
A : “영화 만들 때만 팀을 구성했고, 다 혼자 한다. 예를 들어 비닐 봉투 사진 5만 개가 필요하다고 할 때, 실제로 준비하는 것은 20개 정도다. 이것을 다양한 각도와 형태로 촬영해 500개쯤 만들어낸 뒤 복제하고 배치한다. 한 작품에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한국서 다큐 ‘알바트로스’ 등 64점 첫선
그는 2009년 북태평양의 작은 섬 미드웨이로 갔다. 백만 마리 이상의 알바트로스가 서식하는 곳이다. 수많은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던 그에게 한 생물학자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은 새들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숫자가 아닌 현실을 담고 싶었다. 이곳을 8년간 여덟 번 오가며 만든 1시간 37분짜리 다큐멘터리 ‘알바트로스(Albatross)’(2018)는 지난해 런던 세계보건영화제에서 그에게 대상을 안겼다. 이 이야기가 담긴 『크리스 조던: 아름다움의 눈을 통해 절망의 바다 그 너머로』(인디고 서원)가 이번 전시에 맞춰 출간됐다.
“알바트로스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1만 6000km 이상을 날아갑니다. 바다 표면에 떠있는 먹이를 빠르게 낚아채는 방식으로 식량을 구하죠. 배를 가득 채우면 섬으로 돌아와 새끼에게 음식을 게워 먹입니다. 바다가 제공하는 것을 믿고 새끼에게 먹일 뿐인데, 알바트로스는 플라스틱이 뭔지 모르고 저는 안다는 게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뱃속이 쓰레기로 가득찬 새가 눈 앞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자신이 너무 무기력했다. 하지만 그는 새를 외면하지 않았고, 함께 있어 주었다. 그때 깨달음을 얻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슬픈 만큼 그 새들을 사랑했던 것이죠. 슬픔의 느낌을 경험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나의 존재가 얼마나 충만한지 발견했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죽은 새 위로 펼쳐진 파란 하늘과 하얀 새들의 비행을 보면서 아무리 끔찍한 일을 경험하더라도 그만큼의 아름다움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됐죠. 모든 슬픔을 느끼려 하는 것, 모든 아름다움을 알려고 하는 것, 이 세계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준다고 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내면에 있는 지구와 생명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며. 자기 내면의 소리에 솔직해진 사람들은 자연스레 현명하고 훌륭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기에.
이를 위해 뭔가 빨리 해야한다는 강박증에 빠져 문제의 본질을 놓치거나 작은 변화와 아이디어로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복잡한 문제에 간단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방법을 알려주려 하는 것은 심지어 무례한 일이기도 하죠. 진짜 문제는 해결 방법에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이 얼마나 바뀌어왔는지 되돌아보라는 것이 그가 책에서 들려주는 조언이다.
재단법인 숲과나눔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 ‘숫자로 본 미국인의 자화상’ 시리즈와 ‘만다라’ 영상, 그리고 영화 ‘알바트로스’ 등 총 64점을 볼 수 있다.
이 중 나란히 전시된 두 작품은 작가의 의도를 한눈에 보여주었다. 옛 보헤미아의 오래된 숲 슈마바의 풍광을 찍은 사진과 미국 슈퍼마켓에서 매시간 사용되는 갈색 종이봉지 114만개를 활용해 대나무 숲 같은 정취를 구현한 ‘종이 가방’이다. 특히 진짜 숲을 찍은 사진은 앞줄 나무부터 뒷줄까지 너무도 생생해 마치 회화 작품 같았다. 비법을 물어보니 “전체 화면을 50개로 나눠 각각 구분해 찍고, 각 부분은 포커스 스태킹이라는 최신 기법을 활용해 줌인해가며 여러 차례 찍은 뒤 합성했다. 장노출을 주고 찍다 보면 4시간쯤 걸리는데, 바람이 없고 일조량도 같아야 해서 촬영이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미세먼지 주제로 하는 작품 만들어 볼 것
미드웨이 섬에서 알바트로스의 주검들을 찍은 사진은 과연 참혹했다. 뱃속에서 나온 형형색색 원색의 쓰레기 앞에 인간은 할 말을 잃어야 했다. 사진가는 “이 사진은 인공적으로 손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찍었다”라며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말했다.
2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는 고스란히 한 편의 시(詩)였다. 먹먹했다. 인터넷 ‘알바트로스 프로젝트(albatrossthefilm.com)’에서 무료로 볼 수 있으니 일견을 권한다.
현재 예술가인 아들 에머슨과 함께 『하나만을 바라보다(Centered Seeing)』를 쓰고 있다는 크리스에게 “한국인들이 요즘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니 “그것도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하는 것이 나의 일이니까”라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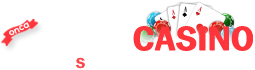





 북기기
북기기 streem
streem 비트팟
비트팟 비공개
비공개 모스코스
모스코스 마법사
마법사 비노
비노 이실장
이실장 오잉
오잉 아이리스
아이리스 겨울엔오사카로
겨울엔오사카로 스트롱맨
스트롱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