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고”…라오스 참사 현장 다녀온 활동가의 전언
 비트팟
0
1136
0
0
2019.03.03 21:32
비트팟
0
1136
0
0
2019.03.03 21:32
 지난달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태스크포스(TF)’가 방문한 라오스 아타브주 사남사이군 힌랏 마을의 모습. 댐 붕괴 사고로 나무가 뿌리째 뽑힌 채 방치되고 있었다. TF제공
지난달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태스크포스(TF)’가 방문한 라오스 아타브주 사남사이군 힌랏 마을의 모습. 댐 붕괴 사고로 나무가 뿌리째 뽑힌 채 방치되고 있었다. TF제공
“물이 들어온다!” 이웃의 비명소리가 라오스의 고요한 농촌 마을을 갈랐다. 마을 상류 댐에서 쏟아진 물이 가옥을 덮치면서 ‘쾅’하는 굉음이 뒤따랐다. 주민들은 피할 새도 없이 물길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한 주민은 “물이 차오르는 게 아니라 밀어닥치는 속도로 왔다”며 “배를 타고 도망가려 해도 바로 뒤집어질 정도였다”고 떠올렸다.
지난해 7월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 세피안·세남노이댐 일부가 붕괴하면서 5억t이 넘는 물이 보조댐 아래 있던 6개 마을을 덮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각각 시공과 운영을 맡은 댐이었다. 마을 전체가 황토물에 잠긴 사진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구호의 손길이 쏟아졌다.
언론의 관심이 사그러들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고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구호 물품은 끊겼다. 임시 거처 상황도 열악하다. 라오스 정부가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관련 정보는 엄격히 통제된다. SK건설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푸 주에서 SK건설이 건설 중인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보조댐이 무너지면서 인근 마을이 물에 잠긴 모습. 신화연합뉴스
지난해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푸 주에서 SK건설이 건설 중인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보조댐이 무너지면서 인근 마을이 물에 잠긴 모습. 신화연합뉴스
윤지영 피스모모 정책팀장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 지난달 11~24일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그에게 “여론의 관심이 많지 않은데도 TF 활동을 하는 이유”를 묻자 “댐 사업 초기부터 여러 문제점들을 모니터링했던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라오스 정부의 정보 통제와 한국 기업들의 책임 회피를 보며 “시민단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좌절감을 많이 느꼈다”면서도 “한국의 개발협력사업 규모가 늘어나는만큼 제2의 라오스 사고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삶의 터전 잃은 주민들
TF가 만난 주민들의 증언은 한결 같았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밤 8시~9시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이를 재우거나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시간이었다. “물이 서서히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벽이 자기쪽으로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어떤 주민은 물이 6~7m 높이로 왔다고도 했고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정신없이 휩쓸려가다가 지붕이나 나무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과 SK건설은 댐 붕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한국서부발전은 2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사고 발생 사흘 전 댐 중앙부에 11㎝의 침하가 발생했고, 23일 오전 현지법인을 통해 이장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주민 대피가 시작됐다”는 경과 보고서(경향신문 7월26일자 1면 보도)를 제출했다. SK건설 역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사고 당일 주민들을 대피시키라는 공문을 지역 당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활동가는 “우리가 만난 주민 중에 댐이 무너질 것이라고 안내를 받은 이는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로 정보가 중앙정부에서 주정부, 도청과 군청, 지역사회까지 수직적으로 내려온다. 정보 체계의 가장 말단에는 마을 이장이 있다. TF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4개 마을 이장을 모두 만났지만 라오스 정부로부터 내려온 관련 공문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활동가는 “한 마을의 이장은 ‘물이 들어올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우기에 벌어지는 흔한 침수 정도로 생각해 낮은 곳에 있던 물건을 높은 곳에 올리는 정도로 대비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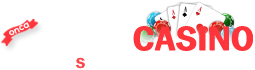


 북기기
북기기 보헤미안
보헤미안 streem
streem 비공개
비공개 모스코스
모스코스 마법사
마법사 비노
비노 이실장
이실장 오잉
오잉 아이리스
아이리스 겨울엔오사카로
겨울엔오사카로 스트롱맨
스트롱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