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정 교수 “손소독제가 바이러스만 죽이는 게 아니다
 북기기
0
192
0
0
2022.03.21 00:58
북기기
0
192
0
0
2022.03.21 00:58
3년 연속 세계 피인용 상위 1% 연구자(약리학 및 독성학 분야),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창조대상(2015), 사회혁신유공 대통령 표창(2019). 박은정 경희대 의대 교수를 수식하는 말이다. 박 교수는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생활화학제품 내 화학물질 등 일상 속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 발생 기전을 주로 연구하는 독성학 전문가다. ‘비(非)SKY’ 출신에다 경력단절을 겪었으며, 본래 면역학 전공이었다는 이력도 따라붙는다.
수식은 본질을 가린다. 수식어가 지나간 자리에 오롯이 남는 건 ‘독성학자 박은정’이다. 그가 최근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경희대 출판문화원)를 출간했다.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법’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대중서다. 실험실에서 1년 365일을 꼬박 보내는 독성학자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설명하겠다고 직접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박은정 교수를 3월 14일 경희대 소재 실험실에서 만났다. 그는 인터뷰 내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선 생활 속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소독제 사용을 지켜보며 들었던 고민,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보며 느꼈던 부채감을 언급할 땐 독성학 연구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의 연구 목표는 분명하다.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오늘도 실험실과 바깥 사회를 넘나들고 있다. 박은정 경희대 의대 교수가 출간한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 / 경희대 출판문화원
박은정 경희대 의대 교수가 출간한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 / 경희대 출판문화원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
-대중서를 출간한 계기는.
“누군가 다치고 죽은 다음에 생활화학물질의 독성을 알려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다. 연구 논문이나 보도자료를 냈을 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등의 반응을 댓글로 접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 써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중서를 준비하게 됐다. (독성으로부터의 안전은) 사람들의 공감과 협조를 얻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을 많이 먹으면 생식기에 안 좋다, 성장에 지연이 온다’고 아무리 알리고 싶어도 관련 데이터를 만드는 데만 최소 5개월, 논문으로 인정받기까지는 1년이 걸린다. 그동안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제품이 얼마나 많을까. 단순히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문제다. 정말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다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많은 사람이 조금만 더 생활화학제품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면, 50세에 아플 걸 51세, 60세로 늦출 수 있다. 아픈 채로 살아가야 할 시간을 줄이자는 거다. 그 시간을 벌어야 한다.”
-무엇이 독이고 무엇이 약인가.
“무엇이 독이고 약인지는 소비자, 사용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이 바로 그 얘기다. 생활화학제품은 효과를 보기 위해 만들었다. 그 효과를 제대로 보는 데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독이 되게 하느냐는 소비자들의 몫이다. 연구자로서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 안전성이나 유해성을 밝혀내도, 신제품들이 나오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일반 소비자들이 시간을 벌어주시면 좋겠다. 일반 대중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활화학제품을 안 쓸 수는 없지 않나.
“제품을 사용할 때, 자기 생각(판단)을 넣지 마라. 때가 더 잘 빠지리라 생각해 여러 제품을 섞어 쓰고, 더 큰 살균 소독 효과를 보려고 락스를 넣고 그러지 않나. 그 농도가 과연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지는 검증이 안 됐다. 권장 농도 이상으로 제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효과가 더 커지는 건 아니다. 표기된 사용 방법이 시키는 대로, 용법과 용량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효과를 높이고 건강도 안전하게 유지하는 길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방역 관계자가 2021년 11월 5일 국무회의실을 소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방역 관계자가 2021년 11월 5일 국무회의실을 소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뿌리고 바르고… 소독제 독성 줄이려면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중에 나오는 생활소독제의 개수도 늘었고 뿌리거나 바르는 손소독제의 사용 빈도도 증가했다. 소독제도 엄밀히 보자면 화학물질이지만,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선 소독제의 위험성보다 유용성이 컸다. 그렇다고 계속 사용 빈도를 늘려갈 수는 없다. 위험성이 유용성을 넘어서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서다.
‘4가 암모늄계열’ 성분인 염화벤잘코늄에 반복 노출될 경우 폐 손상 우려가 있다는 박은정 교수 연구팀의 논문이 국제학술지 ‘독성학과 응용약물학’ 온라인판에 지난 2월 22일 게재됐다. 쥐를 통해 관측한 결과, 염화벤잘코늄이 생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농도이더라도 장기간 반복 노출되면 폐 내부에 만성 염증성 병변이 일어났다는 내용이다. 염화벤잘코늄은 코로나19 방역에서 흔히 쓰는 손소독제, 세정제, 방부제, 바닥청소제, 보존제 등 다양한 살균·소독용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이다. 현재 정부는 소독제를 뿌리는 방식보다는 닦아내는 방식을 권하고 있다.
-책 내용 중에 코로나19 초기 분무 소독을 보면서 내적 갈등을 했다는 부분이 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
“가정에서 쓰는 것들이 가장 걱정이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이 판매되기 전에 스프레이(분무)로 뿌린 것이 호흡기를 통해 들어왔을 때 안전하리라는 검증을 거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람의 호흡기에 노출돼도 안전하다는 독성 데이터를 가지고 승인해줬을 거라 기대한다는 얘기다. 즉 바르는 제품은 피부로, 먹는 제품은 경구로 실험하니 스프레이는 호흡기로 실험했으리라 생각하는 거다. 실상은 다르다. 그런 절차 없이 판매된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려면 살균 소독제가 분명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때만 해도 아직 분무 소독 지침이 완벽하게 없기도 했다. 그때는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막는 게 최우선이었으니까 위험 가능성을 말하는 게 괜히 혼란만 주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바닷가에 소독제를 뿌리는 장면을 봤을 땐 이해하기 힘들었다. 소독제 성분은 표면의 흙에 주로 붙어 있다. 바람이 불어 먼지가 일면 호흡기를 통해 들어올 수밖에 없다. 빛이 있더라도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분들은 다 들이마셨다고 봐야 한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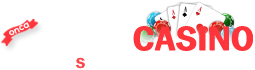


 보헤미안
보헤미안 streem
streem 비트팟
비트팟 비공개
비공개 모스코스
모스코스 마법사
마법사 비노
비노 이실장
이실장 오잉
오잉 아이리스
아이리스 겨울엔오사카로
겨울엔오사카로 스트롱맨
스트롱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