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올지 모를 ‘기술’을 기다릴까, 지금 여기 ‘자연’으로 맞설까
 북기기
0
119
0
0
2023.01.06 15:12
북기기
0
119
0
0
2023.01.06 15:12
이것은 영화 비평이 아니다. 물론 영화를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영화는 아무래도 내 전공이 아니며, 이 때문에 나로서는 영화 평론가만큼 날카롭게 영화적 서사를 분석할 수도, 매력적인 언어로 감수성을 자극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차라리 솔직하자. 나는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란 단지 영화적 세계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영화는 언제나 영화를 초과하는 잉여의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 세계란 누군가에겐 철학일 수 있고 젠더일 수도 있으며 또 다른 무엇일 수도 있다. 특히 나에게 영화는 무엇보다 기술 세계의 상상력과 가능성, 또는 그 부정성을 앞질러 보여주는 일종의 실험이자 증상으로 다가온다.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 영화라는 복제 기술로부터 아우라의 상실과 감각 방식의 변화, 그리고 정치적 대중의 탄생을 읽어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는 영화로부터 영화 외부를 읽어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영화를 통해, 영화와 함께, 또는 영화를 거슬러서 기술을 말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영화 비평이 아닌 기술 비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내 솔직한 대답이다. 물론 영화가 그려내는 기술이란 단연 그것을 가능케 한 사회적 상상력을 전제하는 만큼, 이때의 기술을 읽어내는 작업은 곧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힘과 관계 및 그러한 변화의 궤적을 동시에 읽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자율주행 자동차는 단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이기도 하다. 기술 비평은, 그 기술의 사회성으로 말미암아 결국 기술을 넘어 사회 비평을 향한다. 나는 영화를 소재 삼아서 기술을 비평하고 다시 그럼으로써 이 기술이 지배하고 있는 지금 여기의 사회를 비평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영화인가? 영화만 기술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답은 간단하다. <계몽의 변증법>을 읽어본 사람과 <터미네이터>를 본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많은가? 초대장은 많을수록 좋다.
영화 속 불·물의 대비와 현실
인류, 구원 물질 찾아 타 행성 침탈
‘선’이 이기지만 파국은 연기될 뿐
기술 비평의 첫 번째 영화는 최근 개봉한 <아바타: 물의 길>(이하 <아바타2>)이다. 논의를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 <아바타> 도입부에서 제시하듯이, <아바타2>는 에너지 고갈과 환경 문제에 직면한 인류가 대체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 우주 먼 곳의 행성 판도라에 인력과 군대를 파견하는 미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언옵테늄이라는 물질이 핵심인데, 문제는 상온에서도 핵융합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기적의 물질이 판도라 원주민인 나비족의 생활 터전 바로 밑에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한 곳의 구원은 다른 한 곳에는 분명 착취였다.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이후의 이야기는 값비싼 자원과 삶의 공간을 둘러싼 인간과 나비족, 기술 문명과 자연, 기계와 생명, 폭력과 저항 등 이항대립 사이의 치열한 다툼으로 전개되어간다. 영화는 영화이기에 결국 싸움은 나비족의 잠정적인 승리로 일단락되지만, 항상 그렇듯 파국은 단지 연기될 뿐이었다.
<아바타2>는 이로부터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구에서는 그 15년 동안 환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서 이제는 아예 행성 이주를 목적으로 대규모 우주선단을 파견하기에 이른다. 같은 기간 동안 기술 또한 급속도로 발전해서, 전작에서는 주인공(제이크 설리)만 어렵게 성공했던 영혼 이식이 2편에서는 마인드 업로딩의 형태로 대중화되어 이미 죽은 사람마저도 아바타로 부활시킬 수 있다.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으로 급기야 지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술 발전은 더욱 빠른 속도로 밀어붙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반면, 나비족은 그 15년 동안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재건하고 아이를 낳아 양육하면서, 그렇게 다시 이전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복원해나간다. 기술 문명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던 삶의 터전도 서서히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가는데, 이는 나비족이 만물의 어머니인 에이와(Eywa), 즉 대자연의 힘을 믿고 그 힘에 순응하면서 철저히 자연적인 삶을 살아냈던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에 기술의 힘이 있었다면 다른 한편에는 자연의 힘이 있었던 셈이다.
물론 이 대비는 영화 속 사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사실상 이 영화는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이분화된 담론적 경향성을 SF라는 영화적 언어로 번역해낸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영화를 초과하는 잉여의 세계, 영화 비평이 기술 비평과 만나면서 사회 비평으로 향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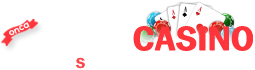


 보헤미안
보헤미안 streem
streem 비트팟
비트팟 비공개
비공개 모스코스
모스코스 마법사
마법사 비노
비노 이실장
이실장 오잉
오잉 아이리스
아이리스 겨울엔오사카로
겨울엔오사카로 스트롱맨
스트롱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