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더러가 뛰면 나달·조코비치도 뛴다
 보헤미안
1
518
0
0
2020.02.04 00:19
보헤미안
1
518
0
0
2020.02.04 00:19
30대 노장 ‘페나조’ 롱런 비결은
조코비치, 호주오픈 8번째 우승
2017년 이래 3명이 메이저 석권
장비 좋아지고 서로에게 자극제
‘페나조 시대’. 한국 테니스 팬들이 이름 붙인 세계 남자 테니스의 현재다. 로저 페더러(39·스위스·세계 3위), 라파엘 나달(34·스페인·2위), 노박 조코비치(33·세르비아·1위) 성(姓)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셋 중 가장 어린 조코비치가 첫 메이저 타이틀(호주오픈)을 차지한 2008년부터 따져 벌써 12년째다.
30대 중·후반으로 은퇴를 고민하거나 내리막을 걸어야 할 나이인데, 셋은 여전히 세계 1~3위다. 2일 끝난 올해 호주오픈에서 조코비치는 대회 통산 8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페더러는 4강, 나달은 8강에 들었다. 2017년부터 이번 대회까지 메이저 타이틀(호주오픈·프랑스오픈·윔블던·US오픈) 13개를 ‘페나조’가 휩쓸었다. 나달, 조코비치가 5회씩, 페더러가 3회다.
최근 몇 년 사이 페나조에 도전하는 신예들이 속속 등장했다. 메이저 대회 준우승만 3차례인 도미니크 팀(27·오스트리아·4위), 페더러 및 조코비치와 2승2패로 팽팽하게 맞선 스테파노 치치파스(22·그리스·6위), 최근 4년간 투어 우승만 11회인 알렉산더 즈베레프(23·독일·7위) 등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페나조를 넘어섰다고 말하기 힘들다.
페나조는 왜 스러지지 않을까. 호주 방송사 ABC는 지난달 24일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는 테니스 선수 나이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 전에는 30세면 선수 생활을 끝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신발, 라켓 등 장비가 기술적으로 발전해 부상 위험은 줄었고 선수 수명은 늘었다”고 전했다. 지금 선수들은 이전 시대 선수보다 상대적으로 오래 선수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30대 중·후반에 톱 랭커 자리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페나조가 건재한 이유로 ‘라이벌 효과’가 꼽히기도 한다. 항상 비교되는 라이벌이 있으면 부담감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반면 스스로 빠르게 성장하는데 이만한 자극이 없다. 이들은 우승과 세계 1위 자리를 놓고 늘 서로를 의식하며 견제했다. 메이저 대회 기간에는 서로에 대해 언급도 잘 하지 않았다.
이들도 나이가 들면서 다소 편해졌다. 지난해에는 경기 전 함께 연습하는 장면이 종종 목격됐다. 조코비치는 호주오픈 기간이던 지난달 25일 “우리 셋은 각자 성격이나 경기 스타일이 달라 경쟁 관계에 있었다. 요즘은 선수로서, 사람으로서 성숙해졌고, 우리 관계도 달라졌다.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고 말했다.
페나조는 라이벌을 넘어 동반자다. 30대 들어 돌아가면서 부상과 슬럼프를 겪었다. 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나달은 2015~16년 손목 부상으로 고생했다.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이 8강이었다. 무적이던 프랑스오픈에서도 2015년 8강, 2016년 32강에 그쳤다. 페더러도 2016년 무릎을 다쳐 고전했다. 그해 프랑스오픈과 US오픈에 불참했다.
둘이 없는 사이 조코비치가 승승장구했다. 2015년 윔블던과 US오픈, 2016년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까지, 4대 메이저 대회를 연속으로 우승했다. 하지만 직후부터 2018년 초까지 내리막을 걸었다. 멘털이 흔들렸고 팔꿈치 부상이 심했다. 투어를 잠시 떠나기도 했다. 어두운 터널을 각각 빠져나온 페나조의 관계는 단단해졌다.
조코비치는 “페더러와 나달이 있어서 이 나이에도 계속 전진한다. 우리 셋은 서로 경쟁하면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나달은 “이제 우승보다 오래 코트에서 뛰는 것을 생각한다. 페더러를 보면 나도 더 오래 뛸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페더러는 올 시즌을 앞두고 “내년에는 뛰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페더러가 뛴다면, 나달도 조코비치도 뛸 것이다. 페나조 시대의 끝은 아직도 멀어 보인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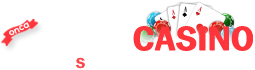






 행복의문
행복의문 북기기
북기기 streem
streem 비트팟
비트팟 비공개
비공개 모스코스
모스코스 마법사
마법사 비노
비노 이실장
이실장 오잉
오잉 아이리스
아이리스 겨울엔오사카로
겨울엔오사카로 스트롱맨
스트롱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