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나는 배구, 기는 농구…2010년대 두 ‘겨울 스포츠의 꽃’ 희비 쌍곡선
 보헤미안
0
548
0
0
2019.12.27 11:52
보헤미안
0
548
0
0
2019.12.27 11:52
겨울철 프로 스포츠를 양분하는 프로농구와 프로배구는 2010년대에 희비의 쌍곡선을 그렸다. 한때 구름 관중을 몰고다니며 오빠 부대를 거느렸던 농구는 갈수록 인기가 떨어졌다. 스타의 부재, 잦은 오심 논란과 외국인 선수 제도 변경 등은 팬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다. 반면 배구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농구보다 프로에 늦게 뛰어들고 연고지역 규모나 경기장 크기 등이 작아 아직 평균 관중수에서는 농구에 뒤지지만 시청률에서는 크게 앞선지 오래다. 10년 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2010년대 두 스포츠의 엇갈린 현실과 꼭 맞다.
1990년대 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뜨거웠던 농구 열기는 이제 옛날 일이 됐다. 실업 시절 인기를 발판삼아 1997년에 출범한 프로농구는 2000년대까지는 확실한 겨울 스포츠 ‘넘버원’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면서 이상 기류가 흘렀다. 프로농구는 2011~2012시즌 119만525명(정규리그 기준)의 관중을 기록한 이후 내리막을 타고 있다.
2014~2015 시즌에 104만3515명을 기록한 이후 이제 한 시즌 100만명은 꿈의 벽이 됐다. 2015~2016 시즌 93만7056명으로 떨어졌고, 2017~2018시즌에는 75만4981명으로 바닥을 찍었다. 평균관중도 처음으로 2000명대로 떨어졌다. 100만 관중이 무너진 2017~2018 시즌 평균 시청률은 0.18%에 그쳐 처음으로 0.2%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농구가 최악의 흥행 성적표를 받은 2017~2018시즌에 프로배구는 남자부 평균 0.87%, 여자부 0.77%로 앞선 시즌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케이블 중계 채널이 많고 중장년 팬이 많아 출범 초부터 시청률에서는 배구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구와 4배 이상 차이를 벌리면서 두 종목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했다.
배구는 2010년대에 남자부에서는 세계 정상급 외국인 선수들을 잇달아 영입하며 팬들의 관심을 높였다. 여자부는 2012년 런던 올림픽 4위와 ‘배구계의 메시’ 김연경의 등장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특히 여자배구는 최근 2~3년간 급속도로 인기가 높아졌다. 지난 3월에 열린 도로공사와 흥국생명의 챔피언결정전 3차전에서 무려 2.68%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지난 5월 발간한 ‘프로스포츠 관람객 성향 분석 조사’에는 의미심장한 지표 하나가 있다. 팬들을 상대로 ‘응원팀을 변경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프로농구는 ‘감독’ 때문이라는 답변이 5대 프로스포츠 가운데 월등하게 가장 높았다. 농구는 9.1%로 남자 배구 3.5%, 여자배구 2.7% 등과 큰 차이를 보였다. 대개 좋아하는 선수의 이적이나 거주지 변경으로 응원 팀을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농구는 감독의 영향력이 컸던 것이다. 이는 과거 실업과 프로농구 초창기 스타였던 이상민, 문경은 등 왕년의 오빠 감독들이 아직도 리그의 흥행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현재 프로농구판을 이끌어갈 대형 스타가 나오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배구에는 김연경 이후에도 젊고 재능있는 선수들이 속속 나타나며 리그 흥행을 이끌고 있다. 구단과 선수들의 적극적인 팬 서비스도 한 몫했다. 프로스포츠협회의 같은 조사에서 ‘팬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남녀 배구만 유일하게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60% 이상을 넘었다. 배구는 경기 후 팬에게 싸인하고 사진을 찍는 팬서비스가 일상화 돼있다.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프로농구도 2019~2020 시즌 들어 각 구단들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방송 출연 등으로 인기 회복에 적극 나섰다. 2라운드까지 지난 시즌보다 20% 넘게 관중이 증가하며 긴 침체에서 깨어날 조짐을 보였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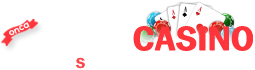


 북기기
북기기 streem
streem 비트팟
비트팟 비공개
비공개 모스코스
모스코스 마법사
마법사 비노
비노 이실장
이실장 오잉
오잉 아이리스
아이리스 겨울엔오사카로
겨울엔오사카로 스트롱맨
스트롱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