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따라하던 야구, 이젠 ‘코리안 스타일’ 싹이 자란다
 아이리스
0
636
0
0
2019.08.10 08:36
아이리스
0
636
0
0
2019.08.10 08:36
지난 7월 13일 ‘꽃’ 이범호(KIA)가 은퇴경기를 치렀다. 이범호는 프로야구 역대 13번째로 개인 통산 2000경기에 출전했다. 2000년 한화에서 데뷔한 이범호는 이날 친청팀과의 맞대결을 은퇴무대로 장식했다. 현 소속구단 KIA의 배려가 따뜻했다. 야구계에서 리더십을 인정받는 그는 “구단과 상의해 해외 지도자 연수를 준비 중”이라고 은퇴 이후 계획을 소개했다.
이범호는 야구계 선배를 통해서도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2006년 WBC대회에서 이범호와 국가대표팀을 이뤘던 박찬호가 ‘미국파 형님’답게 이범호가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연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박찬호는 2년 전 이호준(NC 타격코치)의 일본 요미우리 연수를 직접 연결해 준 바 있다. 또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는 홍성흔(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마이너리그 코치)을 연결해 주었다.
현역 시절 패기 넘치는 허슬 플레이로 많은 사랑을 받은 홍성흔은 2017년 미국에 건너가 지난해부터 마이너리그팀의 정식 코치가 되었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 내가 원하던 환경이다”고 말하는 홍성흔은 특유의 적극적인 성격으로 동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는 귀국을 염두에 둔 ‘연수’라는 관점보다는 ‘배움’이라는 목적에 충실해 훗날 미국야구 풀타임 지도자로 활약하겠다는 당찬 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 조원우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도 올해 LA 다저스 마이너리그팀에서 연수 중이며 ‘국민 우익수’로 불렸던 이진영(전 kt)은 일본 프로야구 라쿠텐에서 코치 연수를 받고 있다.
홍성흔 등 해외연수 중 … 이범호도 준비
현재 KBO(한국야구위원회) 홍보대사로 활약 중인 ‘국민타자’ 이승엽 역시 조용히 해외연수를 준비 중이다. 이승엽은 최근 국내 프로야구 퓨처스리그 팀을 방문하며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국보’ 선동열 전 국가대표 감독도 최근 뉴욕 양키스 연수 계획을 공개했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국내 지도자의 제대로 된 해외연수는 이광환 당시 OB 베어스 코치(현 KBO 육성위원장)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85년 시즌 뒤 구단과 협의해 일본(세이부 라이온즈)-미국(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으로 이어지는 2년간의 지도자 연수를 경험했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초창기 프로야구는 내용은 달라지지 않고 겉으로만 프로라고 불린, 이름이 바뀐 아마추어 야구였다. 우리는 토너먼트 대회에 익숙해 육상으로 치면 100m 달리기 같은 야구를 했다. 일본, 미국의 시즌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 페넌트레이스의 개념을 이해했고, 그런 운영방식이 우리 프로야구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타격이나 수비 등 책으로 배울 수 있었던 기술적 분야에 비해 투수진을 운용하는 노하우는 현장에서 시즌을 경험하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었다. 지식만 얻는 것만이 아니라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가치였다.”
그는 일본에서는 12개 팀, 당시 미국에서는 26개 팀의 투수진 운용을 매일 기록했다. 소속팀의 경기가 끝난 뒤 꼬박 2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1년간 기록한 내용을 정리해 보니 프로구단이 한 시즌 동안 투수진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라는 개념이 생겼다. 그가 국내로 돌아와서 주창한 투수 분업화와 선발, 중간, 셋업, 마무리 등 각자의 역할을 별 모양 도형의 꼭짓점으로 표현한 ‘스타시스템’의 도입이 그 결과다.
이광환은 1988년 베어스로 돌아와 2군 감독을 지냈고, 이후 베어스에서 감독까지 올랐지만 짧은 시간에 그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당시 선수들은 고사하고, 코치들도 내가 접한 이론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시즌 뒤 선수들을 미국 교육리그에 보냈다. 그 선수들이 직접 그 야구를 경험하면서 이해가 빨라졌다. 그렇게 프로야구다운 시스템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투수 분업화’와 ‘자율야구’로 대변되는 그의 야구는 1994년 LG 트윈스에 이르러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꽃을 피웠다. 이를 계기로 투수 분업화가 우리 야구에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긴 시간에 걸쳐 지도자와 팀들이 우리보다 앞선 야구에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해외전지훈련과 교육리그를 통해서 그 경험이 보태졌다.
이광환 위원장이 지도자로서 해외 야구 문명을 들여와 정착시키던 그 무렵, 1994년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진출은 우리가 미국야구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기폭제가 되었다. 박찬호의 MLB 진출로 야구 관계자는 물론 국내 팬들도 그 야구의 기술과 문화에 익숙해졌다. 이후 서재응, 김병현, 김선우 등이 차례로 야구 최고의 무대로 진출했고 이들은 모두 다시 한국 프로야구에 돌아와 활약했다.
비슷한 시기에 선동열, 정민철, 이상훈, 이종범, 이승엽 등은 국내 프로야구를 거쳐 일본에 진출했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 선수와 지도자로 활약했다. 그들의 경험이 국내 구단에 녹아들면서, 기술과 문화는 점점 보편화했다. 철학과 문화가 다른 일본야구, 미국야구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야구로 다시 태어났다. “일본은 지지 않는 야구를 하고, 미국은 이기는 야구를 한다”는 차이에 대한 표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 관점 역시 국가적 차이보다는 사람과 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결국 야구는 같다”라는 일반론이 공감을 얻고 있다.
미래의 한국 야구 수준 업그레이드해야
현재 우리 프로야구를 이끄는 리더는 그런 야구 문화의 융합 속에 성장했다. 프로야구를 주도하는 SK 염경엽, 최근 수년간 강자의 위용을 유지하는 두산 김태형,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꾸준하고 조용한 강자 장정석 키움 감독 등은 선수나 지도자로서 특별한 해외 경험이 없다. 그러나 충분히 야구를 이해하고 전지훈련과 외국인 선수와의 경험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이론을 정립했다. 오히려 그들이 구축한 ‘한국 프로야구의 시스템’은 메이저리그나 일본야구의 그것에 비해 한국 실정에 더 잘 맞은 효율적인 우리의 시스템으로 자부심과 함께 인정받을 만하다.
자존의 시대다. 우리 야구는 백인천이 일본에 진출하고, 박철순이 마이너리그에서 활약했던 그 시대와는 거리가 멀다. 야구인 이만수 감독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멋진 포수처럼’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야구인 이만수’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이만수’로서 최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이길 것’을 피력했다. 그는 “스포츠를 정치에 연관시키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스포츠인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싶다. 상대의 거친 슬라이딩에도 홈플레이트를 굳건하게 지키는 멋진 포수가 되겠다”는 소신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외교적 갈등을 스포츠에서도 이어가겠다는 분쟁의 의지가 아니다. 스포츠인도 국가적, 사회적 이슈에 분명한 소신을 밝히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행동에 옮긴 적극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푸에르토리코 출신 알렉스 코라(보스턴 레드삭스) 감독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남미 정책에 반해 “팀을 백악관에 초청해도 나는 갈 생각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했던 그런 모습과 닮았다.
지도자 연수를 진행 중인 홍성흔, 조원우, 이진영 등과 이를 준비 중인 이범호, 이승엽, 선동열 등이 경험을 마치고 돌아와 특정 구단의 경기력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KBO리그 차원의 발전, 그 미래의 수준을 높여주면 좋겠다. 구단들도 서로의 상대적 경쟁보다 KBO리그라의 절대적 발전을 위한 동반을 모색하고, 리그는 마치 ‘미스터 션샤인과 의병’ 같은 우리 리더들의 역량을 함께 펼쳐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면 좋겠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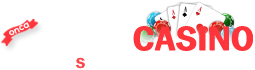




 북기기
북기기 보헤미안
보헤미안 streem
streem 비트팟
비트팟 비공개
비공개 모스코스
모스코스 마법사
마법사 비노
비노